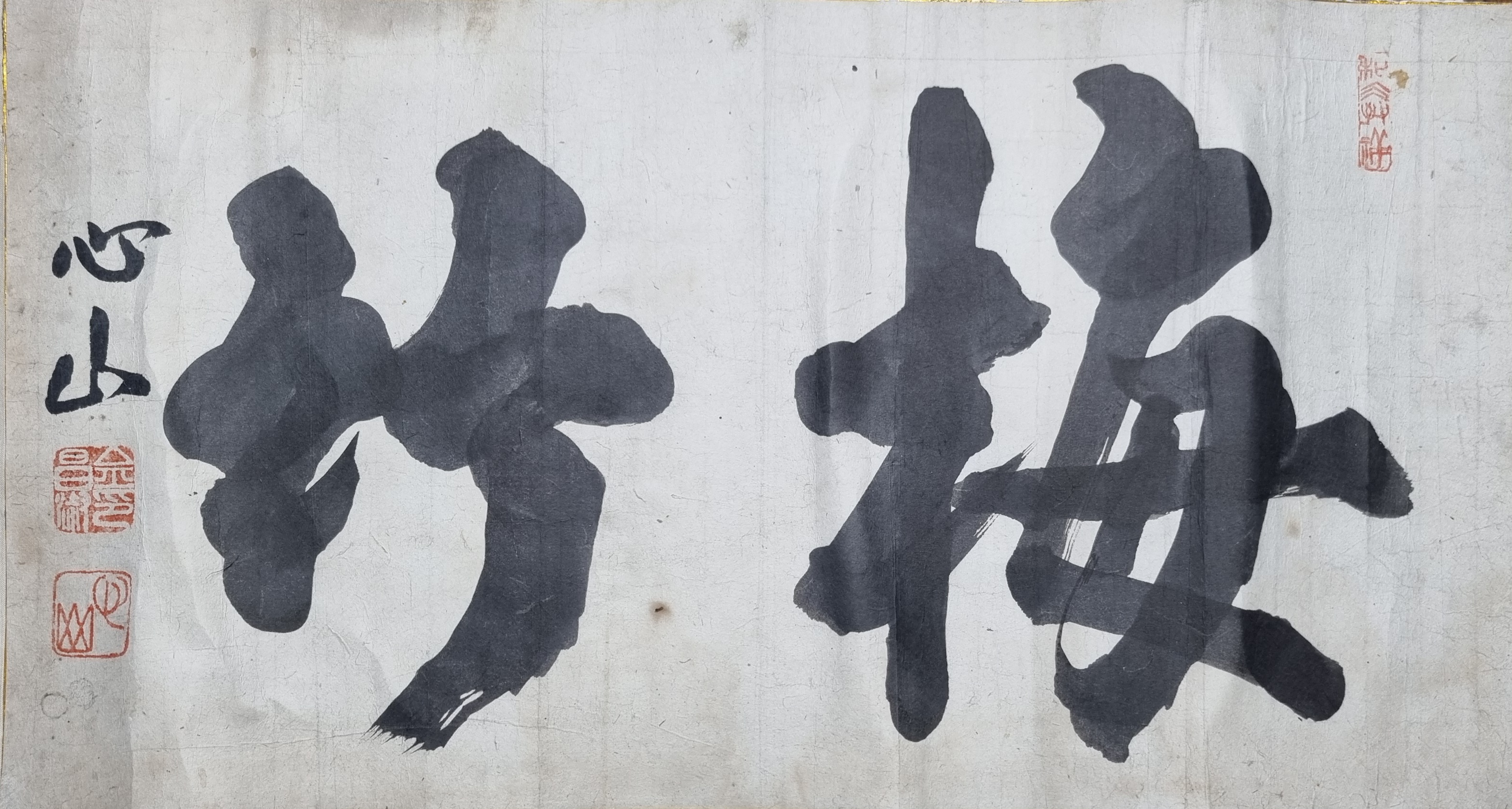비단바닥에 '효제충신 예의염치'(오른쪽부터) 라고 쓴 문자도 민화입니다. 크기는 글자 한자당 대략 가로 14cm, 세로 21.5cm 입니다. 민화에는 문자도, 책가도, 호작도, 모란도, 어회도, 경직도 등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림으로 산수화나 사군자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한자는 원래 그림으로 시작된 것이다. 효(孝)라는 글자는 등이 굽고 머리카락이 드문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모습[老]를 아들[子]가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문자도는 글자의 획에 상징성이 있는 소품이 더해진다. 효(孝)의 글자 획에는 죽순과 잉어 등이 들어가는데 이는 효와 관련된 고사가 그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죽순은 맹종죽(孟宗竹)이라 하는 것으로 중국의 삼국시대에 맹종孟宗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어느 한겨울 날 그의 늙은 어머니가 병이 들어 죽순이 먹고 싶다고 하였다. 맹종이 대나무밭으로 가서 죽순을 찾았으나 추위에 죽순이 있을 리가 없어 비통한 마음으로 간절히 죽순을 바라며 울자 그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놀랍게도 죽순이 돋아났다고 한다. 지극한 그의 효심에 하늘이 감응한 것이다. 그 죽순을 잘라 어머니를 공양하였더니 어머니는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이 죽순대를 맹종죽이라 하였고, 이 고사를 <맹종읍죽孟宗泣竹>한다.
왕상이어(王祥鯉魚)라는 효심과 관계가 있는 고사에서는 잉어가 등장한다. 왕상 역시 효심이 지극한 진(晉)나라의 사람이었다. 그의 계모가 한겨울에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자 이를 구하러 강에 나갔다. 강물은 꽁꽁 얼어 잉어를 잡기는 어려웠다. 얼음판에 구멍을 내고 낚시를 드리웠으나 며칠을 기다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상심한 나머지 차가운 얼음판에 꿇어앉아 엉엉 울고 있으니 잉어가 쌍으로 튀어나와 마침내 계모를 정성껏 보살필 수 있었다고 한다.
'서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석촌 윤용구 서예 작품 (0) | 2021.10.14 |
|---|---|
| 정진국 정물화 꽃그림 (0) | 2021.01.28 |
| 지공화상 14과송 (0) | 2019.08.05 |
| 서봉 김사달 선생의 서예작품 (0) | 2019.08.05 |
| 독서백편의자현 (0) | 2019.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