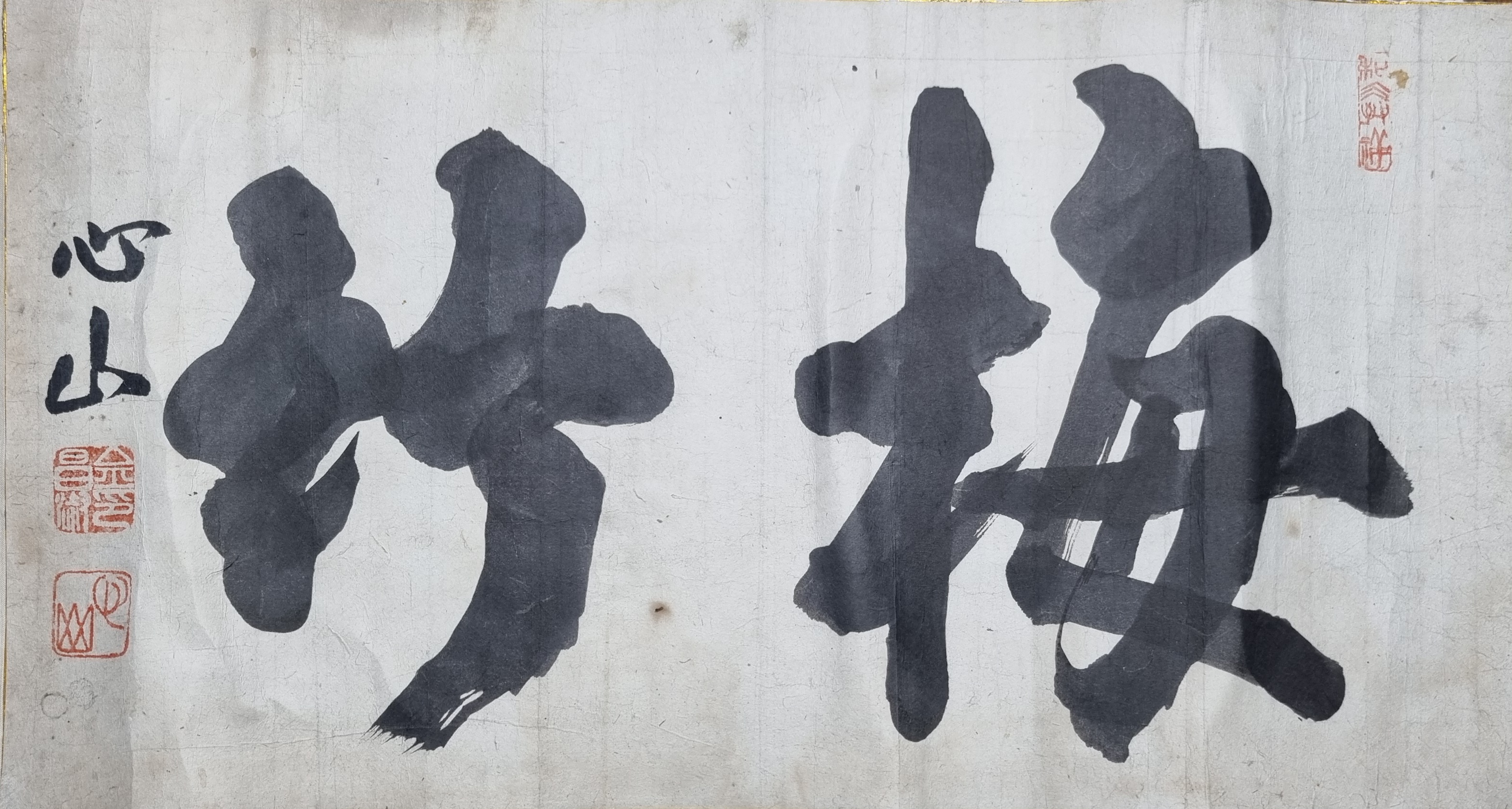마형대구는 청동기시대 말기부터 삼국시대까지 사용한 말 모양의 허리띠 고리(일명 버클)이다. 허리에 차도록 되어 있는 일종의 장식물이다. 원형 또는 타원형의 금구(金具) 한쪽에 고리를 만들어 혁대에 부착시킨 것으로 맞은편의 둥근 고리에 걸도록 하였다. 이러한 청동띠고리의 동물의장(動物意匠)은 북방청동기 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청동기의 실제 사용이라기보다는 의기적(儀器的)인 성격으로 장식성이 가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청동기시대 말기에 나타나 초기철기시대를 거쳐 삼국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형대구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원삼국시대 또는 초기철기시대)의 무덤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는데, 본 마형대구는 안장 부분에 세부 장식이 사라져 있는 점으로 보아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중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