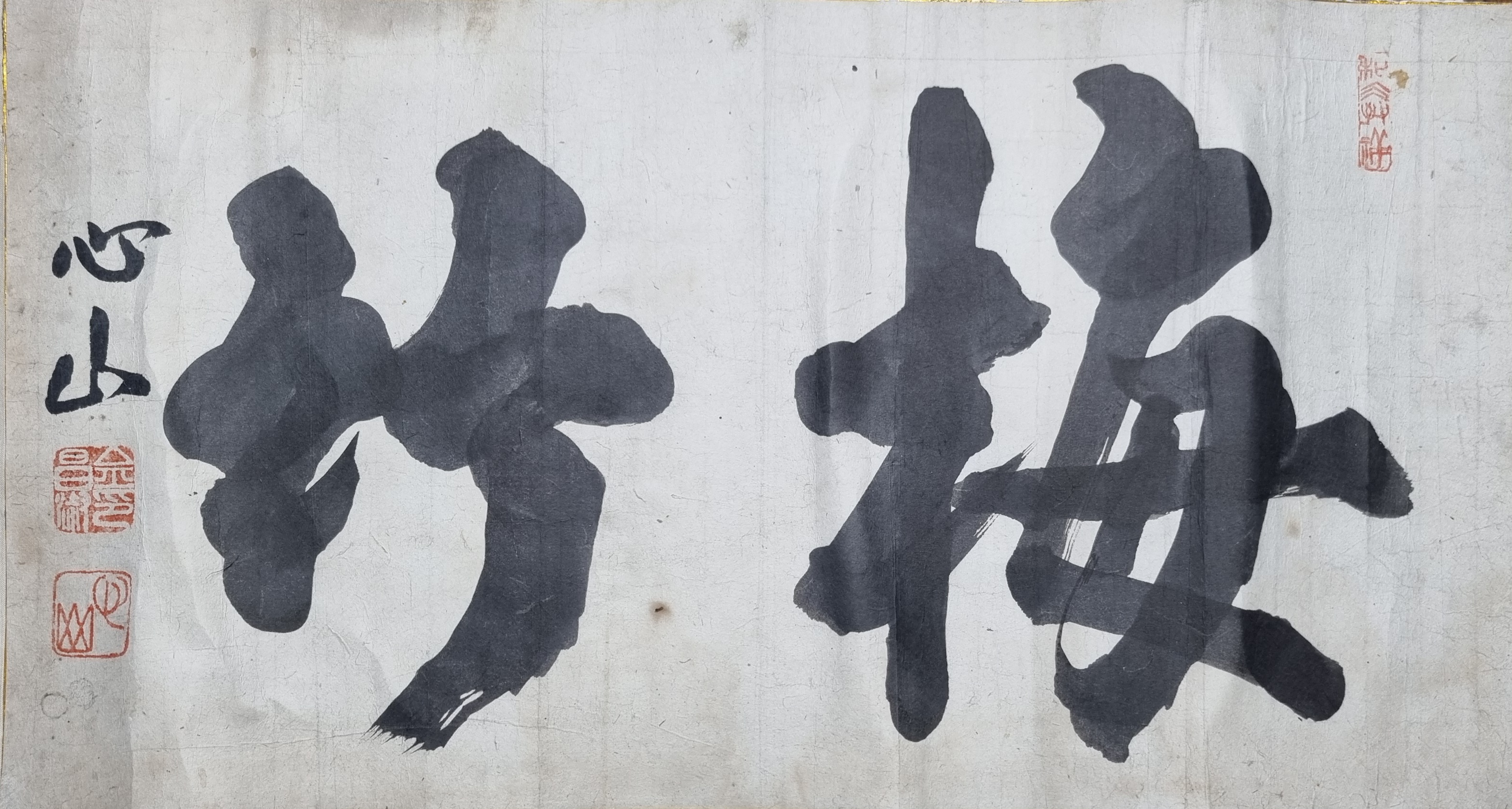사심관(事審官)은 중앙의 고위 관직으로 올라온 지방 세력을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지방을 통제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태조 18년(936) 신라의 마지막 왕 김부가 항복해 오자 그를 경주 사심관으로 삼아 부호장 이하의 관직 등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뒤 다른 공신들도 각각 해당 출신 지방의 사심관으로 임명하면서 이 제도가 널리 시행되었다.
국가의 지방 통치력이 불완전한 가운데 개경에 거주하는 호족들을 통해 지방을 간접 통치하고자 한 것이다. 지방 관제가 정비되면서 사심관 제도 역시 제대로 갖추어졌다. 각 주(州)의 규모에 따라 사심관의 정원도 정해졌는데, 500정(丁) 이상인 주는 사심관 4명, 300정 이상인 주는 3명, 그 이하인 주는 2명이었다. 사심관을 최소 2명으로 정한 이유는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또한, 사심관이 부호장 이하의 관직에만 관여하게 하고 호장을 배제시킴으로써 지방 사회를 사심관과 호장이 독점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사심관과 향리의 결합을 막기 위해 친족이 지방의 호장으로 있는 사람을 사심관에서 제외시켰다. 이처럼 사심관 제도는 지방 세력을 통제하되 권력 집중을 막고 여타 지방 세력과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이르러 사심관이 불법으로 공전(公田)을 차지하는가 하면 서울로 올라온 향리에게 사사로이 형벌을 가하는 등의 폐단을 일으킨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사심관 제도가 임시로 중단되기도 했고, 충숙왕 때에 이르러 완전히 폐지되었다. 사심관 제도의 폐단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지방 세력이 약화되면서 사심관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역사(歷史)'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려시대의 향리 (0) | 2011.04.27 |
|---|---|
| 고려의 과거제와 음서제 (0) | 2011.04.27 |
| 기인제도 (0) | 2011.04.27 |
| 왕건의 호족융합정책 (0) | 2011.04.27 |
| 고려 북진정책의 중요성 (0) | 2011.04.27 |